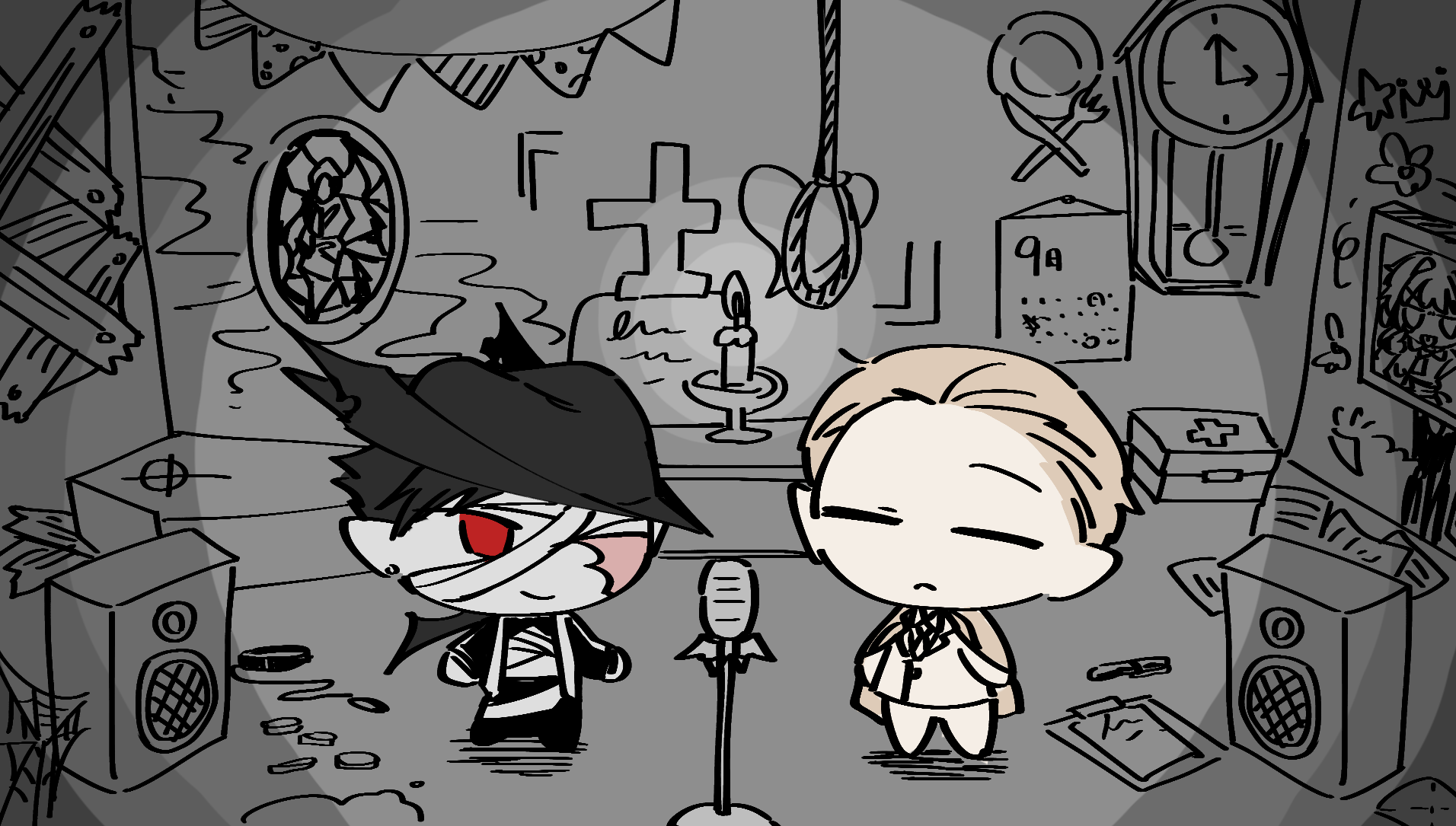가만히 네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본다. 눈을 감고서,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만을 반복하는 너.
그저 가끔 누워서 고양이와 뒹굴대거나 잠시 앉아 쉬거나 하는 명목상으로나 있던 침대였는데, 그 공간에 스며들어와 당연하단 듯이 누워있는 네가 있다.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냥 오늘은 널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침대에서 자 본 적이라고는 가끔 급하게 해가 뜨길래 들어가던 근처 모텔이나 저번 엉망진창이었던 2주 안의 며칠 정도뿐이어서 자연스럽게 가끔 나를 끌어다 옆에 자라고는 눕혀두는 네가 겨우겨우 익숙해져 가는 참인데, 이대로 아직은 조금 낯설고 불편한 이 장소에서 눈을 떴다가 감으면 잠자리의 따스함 같은 건 하나 없이 이불조차 제대로 깔리지 않은 매트리스 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게 아닐까, 이게 전부 환상은 아닐까 하는 묘한 생각이 들어서 널 보고 있는 얼굴에 웃음이 떠오르는 일이 없단 게 조금은 아쉬웠다.
로맨스 애니나 만화 영화 드라마를 보면 사랑하는 연인을 쳐다보는 상대의 얼굴은 늘 웃음이 가득 피어있던데, 나는 그렇지를 못한 게 자고 있는 넌 하나도 모를 텐데도 괜히 미안했다. 나는 자는 사람을 보고 웃어 본 적이 없어. 그야 같은 장소에서 잠자리에 드는 누군가는 언제나 내 곁에 있는 불안감이니까. 그래도 왠지 너랑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널 보고 웃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단 신기한 기분이 들었다.
너는 이상하지, 처음에 만나고 나서 나는 네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사역마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말을 걸어오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집에 놀러 와서는 말하던 대로 사역마들을 보고 마냥 좋아하는 너에게 건넸던 동거 제안을 생각보다 가볍게 받아들이고, 전부 나 때문이 아니라 주변의 무언가 때문이라고 말하기에 그냥 그런 줄 알았더니 그래 놓고는 사실 나를 좋아했대. 그 말들을 하나하나 전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어버린 나도 나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나는 키츠키씨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걸.
그 후로도, 그냥 너를 보면 모든 게 다 이상한 것 같아. 완전히 내 억지에 가까운 부탁을 힘들어하면서도 그냥 들어주기나 하고. 바보같이 굴다가도 가끔 내가 약해지는 것 같으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는 또 갑자기 어리광을 부려 오고. 네가 너무 내 머릿속에서 엉망진창으로 움직여서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다 따라가기가 어려워.
나를 이렇게 좋아한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처음이고, 내가 먼저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받아들여 주는 것처럼 대하는 사람도 처음이고, 가족이 아닌 누군가와 같이 살고 있는 것도 처음이고, 그냥. 너는 꽤 불안해하는 것 같지만 꽤 나도 너와 처음인 게 많아. 나이를 헛으로 먹었습니까? 라고 해도 뭐라고 반박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야 나는 생각보다… 이 400년의 시간을 손안에서 쥐지 않은 채로 그냥 흘러가도록 놔두기만 했단 말야. 내 손에 뭔가 잡힐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먼저 이 손의 틈새를 막아 올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갑자기 처음 보는 담피르가 나타나서는 빈틈없이 손가락 사이에 자기 손을 끼워 넣고는 꽉 잡아버렸잖아. 그래서 이쪽도 생각보다 이것저것 삐걱거리고 있다고, 한 손이 멋대로 남한테 잡혀서 못 쓰게 되어버렸다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났지, 그냥 멍하니 널 쳐다보면서 생각을 하다가 이불을 손으로 그러쥐면 차갑게 식어서 적당히 기분 좋은 면의 촉감이 손바닥 안을 꽉 채운다. 너는 짧게 짧게 끊어 자는 타입이니까 이대로 계속 눈을 뜬 채 널 쳐다보고 있다가는 곧 잠에서 깬 너랑 시선이 맞아버리겠지.
그러면 나는 뭐라고 변명하지? 나도 모르게 눈이 그냥 일찍 떠졌어, 오늘은 키츠키씨랑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싶어서 일찍 일어났어. 먼저 일어나서 놀래켜 주고 싶었어… 뭐가 됐던 잠이 많은 내가 하는 말이니 너는 믿지 않을 게 뻔하다. 그러고는 잠을 안 잤냐고, 자기가 아는 가단이 맞냐고 물어보기나 하겠지. 아니라면 조금 신기할 것 같지만 실제로 나는 네가 잠에서 깨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해답 풀이는 불가능하다.
네가 깨기 전엔 잠들어야지. 새벽 동안 네가 자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몸을 고쳐 눕고는 눈을 감았다. 팔을 이불 안으로 다시 집어넣으면, 차가운 흡혈귀의 체온이 아닌 따뜻한 담피르의 체온으로 데워진 따뜻하고 포근하다는 느낌이 편안해서 관이 아닌데도 신기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